후쿠에 준
'아인슈타인의 숙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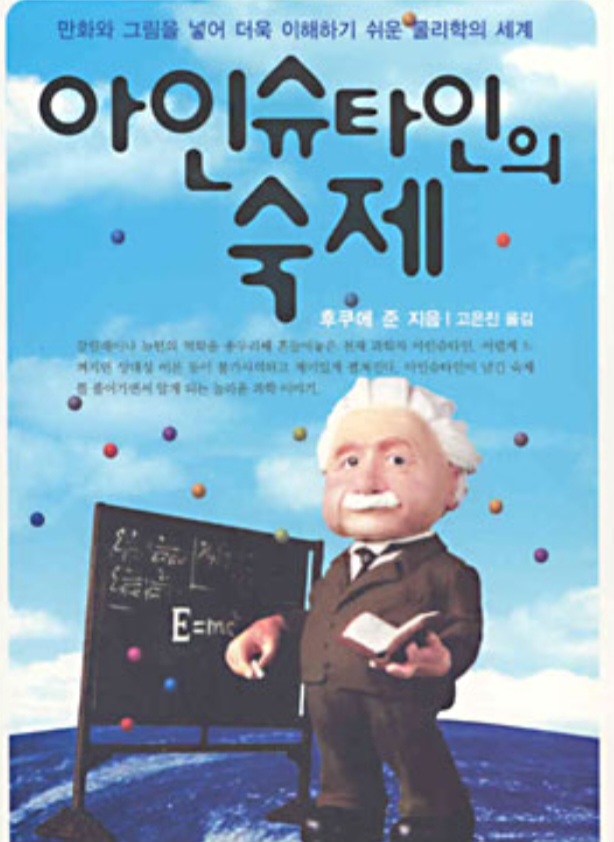
시간이 많은 듯 하면서도 바쁘게 지나가는 2023년의 10월 마지막 주, 그 동안 기사 시험과 기능사 시험 준비 등 삶의 굴레 속에 사색과 혼자만의 시간적 여유도 없이 흘러가는 메마른 나의 과학적 정서와 학문적 사고를 위해 추위를 몰고 오는 늦가을에 <아인슈타인의 숙제>를 골라 읽는다.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이론과 특수상대성이론을 심도있게 읽었다. 그 동안 과학에 못말라 갈증에 허덕이던 '상대성이론'의 체계화된 내용을 읽고 흥분을 넘어 전율을 느꼈다. 여러가지 다른 주제를 상대성이론에 입각해 설명하고자 하는 이 책의 내용 중에서 특히 감명 깊었던 부분은 "정지 우주와 빅뱅이론"이다.
빅뱅이론은 우주의 생성이론으로 고대의 각국의 우주탄생 신화는 그 시대의 문화나 생활환경을 반영하고 있다. 모두 아인슈타인의 정지이론과 매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2세기의 프톨레마이우스 (Ptolemaeos)는 우주의 중심은 지구라는 천동설을 주장해 1,400년 동안 서양세계를 지배해왔다. 그러나, 16세기에 코페르니쿠스 (Copernicos)는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지동설을 주장하고 케플러(Kepler)가 지지하고 갈릴레이(Galilei)가 코페르니쿠스의 체계를 완성했다. 17세기 후반에 뉴튼(Newton)은 역학 체계를 구축하여 분자운동에서 우주 천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학적 현상을 지배했다. 그의 우주는 무한히 확대되는 절대공간이었다.
20세기 초에 아인슈타인이 시간과 공간, 물질에 관한 일반 상대성 이론을 구축했다. 그는 시공간과 물질의 관계를 하나의 방정식으로 도출했다. 좌변은 시공간의 계량구조, 즉 시간이나 공간의 휘어짐 등을 나타내고 있다. 우변은 물질(에너지)의 분포를 나타냈다. 이 등식에 따라 물질은 시공간의 휘어짐에 따라서 운동하고, 또 시공간의 휘는 정도는 물질의 분포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다.그는 우주의 물질은 한결같이 분포하고 있다는 일양성의 가정과 물질의 분포에는 방향성이 없고 우주의 어느 방향을 보더라도 물질은 똑같이 분포하고 있다는 등방성의 가정을 두고 있다. 이 두 가정을 합쳐 오늘날 '우주원리'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아인슈타인의 "정지 우주"이다. 우주가 정적이며 시간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아인슈타인은 방정식을 사용해 정지우주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물질만 분포되어 있으면 그것들은 중력에 의해 서로 끌어 당기므로 가만히 정지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는 좌변에 거리에 비래하는 척력으로 작용하는 "우주항"을 도입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으로 '올리버 패러독스'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주가 무한하고 별로 가득차 있다면 우주의 어느 방향을 보더라도 그 방향으로 시선을 연장시켜 가면 어딘가에서 반드시 별의 표면에 닿게 된다. 그 때문에 어느 방향을 보더라도 별의 표면을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고 어느 방향에서나 별의 표면의 밝기로 빛날 것이다. 즉, 무한 우주에서는 밤하늘의 어두운 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의 '정지 우주'에서도 우주는 별빛으로 남기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밤하늘이 어두운 것과 모순된다. 오늘날, '올리버 패러독스'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고 우주의 나이가 유한하다는 두 가지 이유로 해결하고 있다. 우주가 팽창하고 았기 때문에 그 만큼 별빛이 퍼지는 현상으로 빛이 엷어져서 먼 곳으로 부터 오는 빛이 전체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이다. 또 하나는 우주가 무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겨난 지 100억년 정도밖에 지나기 않기 때문에, 우주에 별빛이 가득 차기까지 아직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대의 과학은 우주는 팽창하는 이론이 지배적이다. 과거에 지배했던 '닫힌 우주' 다음에 이어졌던 '평탄한 우주', 오늘날의 '열린 우주'의 이론에 따르면, 고온 고밀도의 상태에서 시작해 팽창하고 넓어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우주를 예상하는 것으로, 지금으로부터 40억년 쯤 후에 태양의 중심에서는 수소가 타고 태양은 팽창하여 적색거성이 되어 지구를 삼켜버릴 수도 있다. 은하계의 미래는 은하계가 소진되어 사라지는 은하계도 있을 것이며 새로 탄생하는 은하계도 있을 것이다. 별들의 미래는 비관적이다. 별들 사이의 가스가 고갈되어 새로운 별도 생겨나지 않을 것이며, 100조년 후에 마지막 별의 빛이 꺼지고 우주에는 어둠의 장막이 내릴 것이다. 물질의 미래로는 은하의 중심에는 태양의 1억 배나 되는 질량을 가진 초 거대한 블랙홀이 생겨날지도 모른다. 그런데 보통 별이 꺼진 이러한 암흑 우주에서도 가끔 빛이 나타나기도 한다. 블랙홀의 미래도 역시 절규의 함성이 들린다. 물질이 붕괴되고 양자가 붕괴된 후에 우주에 남겨진 마지막 천체는 크고 작은 갖가기 크기의 무수한 블랙홀이다. 따라서 남아있던 양전자, 중성미자, 파이 중간자, 광자 등도 함께 서서히 사라질 것이다. 블랙홀이 증발한 뒤에는 우주의 팽창에 의해서 에너지가 작아진 광자, 중성미자, 전자와 양전자 등이 과거의 우주의 망령처럼 떠돌 것이다.
우주의 생성이론, 우주의 현재와 미래를 개괄적으로 다룬 이 한권의 책을 읽고 늦게나마 나의 우주관이나 인생관이 다소마나 변회된 듯하다, 인간의 생명이 유한한 것처럼 우주의 생명도 유한하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빛과 우주의 항상성을 깨어난 눈으로 보게되며 가치있는 삶, 보람된 삶을 영위하고 싶은 강한 욕망이 나를 사로잡는다. 우주의 탄생을 야기시켰던 빅뱅에서 시작되는 우주의 최초는 오히려 질서정연한 코스모스이고, 그 후 은하, 별, 행성, 생명, 그리고 지구에 이르기까지 가지각색의 구조 형성이 일어나면서 현재의 복잡한 카오스 상태로 변한 것이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의 도움을 받아 오늘날 우리들은 수 조년 후의 우주의 미래까지 예상할 수 있다. 창조신화인 바빌로니아의 마르두크, 이집트의 여신 누트, 중국의 반고, 그리스의 혼돈의 심연 카오스, 북유럽의 이그드라실의 창조신과 함께 창조신화나 이론은 당시의 기초과학과 도덕이 바탕을 두고, 인간의 생활부터 먼 우주의 이론까지 망라하는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통해 우리는 보다 나은 우주의 삶과 생명체에 대한 경외감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인문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告白錄)' (1) | 2023.11.13 |
|---|---|
| 토머스 프리드먼 '늦어서 고마워' (0) | 2023.10.26 |
|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월든.시민 불복종' (0) | 2023.10.11 |
| 비트겐 슈타인 '논리 철학론' (0) | 2023.10.07 |
| 발타자르 그라시안 '인생 수업' (0) | 2023.09.03 |



